[아침편지] 윤리가 의무가 될 때, 세상은 천국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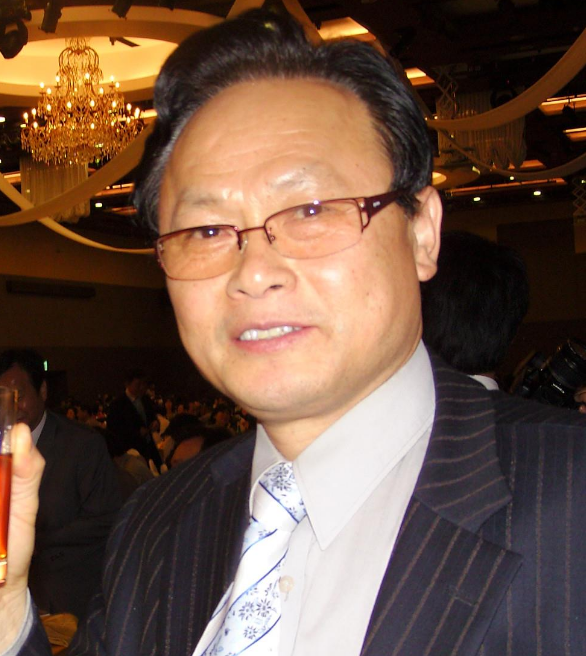
밤이 내려앉자 도시의 불빛은 차갑고,
사람들의 얼굴엔 피로가 스민다.
월백이 물었다.
“법은 인간을 구속하지만, 윤리는 인간을 지탱하지 않을까?”
두견이 대답했다.
“법은 최소의 질서요, 윤리는 최대의 선이지.
그러나 사람들은 강제 되는 법엔 순응하면서도,
강제되지 않는 윤리엔 무감각하더군.”
창밖으로 달빛이 내렸다.
그 빛은 고요했으나 양심은 흔들렸다.
법의 명령은 두려움이었고,
윤리의 속삭임은 부끄러움이었다.
그 부끄러움을 잃는 순간, 인간은 길을 잃는다.
의무의 본질 — 철학의 길 위에서
월백이 다시 물었다.
“두견, 왜 사람들은 옳음을 알면서도 불의를 택할까?”
“이성이 이익에 굴복할 때, 윤리의 의무가 무너지는 법이지.”
칸트는 말했다.
“선의지는 모든 도덕의 근원이라고.”
그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법 앞에 스스로 무릎 꿇는 용기다.
그러나 세상은 윤리에 점점 무감각해 간다.
법은 살아있으나 양심의 언어는 죽어간다.
“덕은 습관이야.” 월백이 말했다.
“악덕도 습관이 되지.” 두견이 답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을 덕의 실천에서 찾았다.
하지만 오늘의 인간은 ‘살기 위해’ 살아간다.
양심을 버리고 편익을 얻었다 자위하며,
악덕은 더 이상 악이라 부르지 않는다.
신뢰의 붕괴 — 윤리의 해체
법은 도시의 울타리요,
윤리는 그 안의 숨결이다.
윤리가 사라지면 믿음이 무너진다.
거래는 계약으로만 이어지고,
약속은 허언이 된다.
말이 증거였던 시대는 갔다.
“신뢰는 보이지 않는 화폐야.”
두견의 말에 월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윤리가 사라진 자리에 법이 늘어나는 거야.
강제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니까.”
윤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법은 폭증한다.
법은 윤리의 빈자리를 메우려 하지만,
세상은 병들어 간다.
강제되지 않는 의무의 품격
정의는 법의 조항이 아니라
윤리적 자율에서 완성된다.
강제되지 않는 의무, 그것이 인간의 품격이다.
월백이 말했다.
“두견, 법이 필요 없는 세상은 천국이 될 텐데…”
두견이 대답했다.
“그건 윤리가 법이 될 때 가능하지 않을까.”
법은 울타리요, 윤리는 숨결이다.
울타리가 무너져도 숨결은 남지만,
숨결이 사라지면 울타리는 생명을 잃는다.

